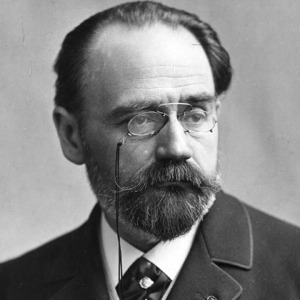폴 오스터, <뉴욕 3부작>을 읽고

폴 오스터의 작품을 처음 읽어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상당히 난해한 소설이었다. 듣기로 폴 오스터는 90년대에 쿤데라, 하루키와 함께 국내 독자들에게 ‘힙한’ 작가로 소비되었다는데,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기엔 서사가 고전적인 형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쿤데라나 하루키랑 비교해보아도 (좋든 나쁘든) 고도로 철학적인 소설에 가까워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은 아니라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국내에 폴 오스터의 작품 대부분이 소개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본격적인 비평이나 읽을만한 후기도 많지 않다(영문학 논문은 몇 편 보인다).
1부와 2부는 구심점 없이 서사를 빙빙 돌린다는 점에서 전형적으로 카프카의 장편소설들을 연상시켰다. 카프카 장편의 특징은 읽는 동안은 지루해서 읽기가 힘든데, 다 읽고 곱씹어보면서 의미적으로 고유한 구심점을 갖추고 있었고, 단지 그것을 제시하는 방식이 다층적인 것이었음을 뒤늦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뉴욕 3부작>의 1, 2부가 딱 그랬다. 개인적으로는 대놓고 카프카와 막스 브로트의 모티브를 끌어오고 있는 3부가 가장 흥미롭게 읽혔다. 작품 곳곳에 인생과 우연에 대한 심오한 아포리즘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완성형의 필력으로 정치하게 배치해 둠으로써 폴 오스터는 대가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낸다.
<뉴욕 3부작>의 1, 2, 3부는 서로를 인용하고 참조하며 인물과 모티브를 공유하는데, 폴 오스터는 일부러 이것이 기계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고 조금씩 어긋나게 설정함으로써 독자와 끊임없이 서사적인 게임을 시도한다. 하지만 독자가 이 퍼즐을 풀겠다고 덤볐다간 오히려 작품의 철학적 핵심을 놓칠 수 있다. 퍼즐 풀이는 그 자체로 풍부한 지적인 유희를 제공하지만, 퍼즐에 몰입하는 순간 독자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감시자들’이 빠지는 것과 동일한 함정에 빠져 헤매게 된다. 그리고 이 함정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쉽게 빠지곤 하는 실존적 함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뉴욕 3부작>의 구성과 폴 오스터의 퍼즐은 매우 계몽적인 구석이 있다.
요컨대 이 작품의 핵심은 개별적인 퍼즐 짜맞추기보다 ‘감시하는 삶의 방식’ 자체에 있다. 1부의 퀸, 2부의 블루, 3부의 1인칭 화자는 모두 감시자로서 감시대상(각각 스틸먼 교수, 블랙, 팬쇼)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데, 어느 순간 감시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거꾸로 감시대상이 감시자를 관찰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최종적으로는 감시대상에 의해 감시자의 삶이 규정 당하게 되는 관계의 역전이 발생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선악의 저편>에 등장하는 니체의 잠언을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Wer mit Ungeheuern kämpft, mag zusehn, daß er nicht dabei zum Ungeheuer wird.
Und wenn du lange in einen Abgrund blickst, blickt der Abgrund auch in dich hinein.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당신을 들여다볼 것이다.
(니체, <선악의 저편> 中)
감시대상(‘심연’)이 삶의 내용이라면, 감시행위는 삶의 형식이다. 우리는 삶의 내용이나 자신만의 화두, 지향점에 몰입하곤 하지만, 어느 순간 삶의 지향점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 몰두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의 형식이나 방식 자체와 그 남루함만을 발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책과 글에 몰두하는 삶은 이런 함정에 빠지기 쉽다. 책과 글은 많은 경우 독자(필자)의 삶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텍스트와 의미, ‘진실’에 몰입하고 전력을 쏟지만, (한국적인 맥락에서 위악적으로 말하면) 그것에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 당도하게 되는 현실적인 삶의 형식이란 ‘저임금 시간강사’이곤 한 것이다.
폴 오스터는 아마도 글 쓰는 사람의 운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저임금 시간강사’가 아니더라도 독자나 저자의 종착점이란 그가 본래 추구했던 ‘의미의 구성’ 따위와는 거리가 멀고, 결국 남는 것은 지적 자기소진과 자기파괴의 잔해 뿐이다. 그렇다면 <뉴욕 3부작>의 주제를 독일교양소설적 의미의 ‘정체성 탐구(자기형성)’ 정도로 파악하는 것은 정반대방향의 독해이다. 오히려 폴 오스터는 자기탐구와 의미형성시도의 결과로서의 ‘윤리적 자기붕괴’의 양상을 제시함으로써 반(反)-자기형성(anti-bildung) 소설을 시도하고 있다. 가장 포스트모던한 방식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윤리적 공허를 짚어내고 있다고 해도 좋다.
1부의 퀸은 잘못 걸려온 전화 때문에 사설탐정 노릇을 하게 된다. 2부의 블루는 영문도 모른 채 의뢰를 받고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3부의 화자도 마찬가지로 뜬금없는 편지 한 통으로 어릴 적 친구인 팬쇼를 추적하게 된다. 누군가의 ‘삶의 형식’을 규정하다시피한 ‘내용’이 정해지는 데에는 사실 어떠한 필연적인 이유나 개연성도 없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뉴욕 3부작>의 인물들이 감시를 하게 된 최초의 계기가 철저히 우연하게 발생한다는 설정이야말로 잔인한 사실묘사이고 폴 오스터가 정교하게 포착해낸 삶의 진실의 한 편린일 것이다.
'인문 >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존 맥스웰 쿳시, <추락>을 읽고 (0) | 2025.05.13 |
|---|---|
| 박상영, <대도시의 사랑법>을 읽고 (0) | 2025.03.13 |
| 황정은, <디디의 우산>을 읽고 (0) | 2025.01.30 |
| 백수린, <여름의 빌라>를 읽고 (0) | 2025.01.29 |
|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하나의 독법 (0) | 2024.01.24 |